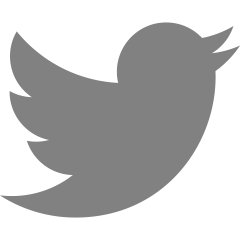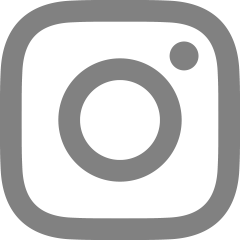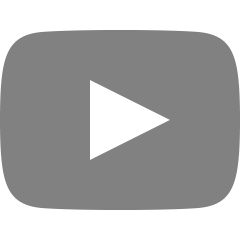[책과 나무]/독립운동사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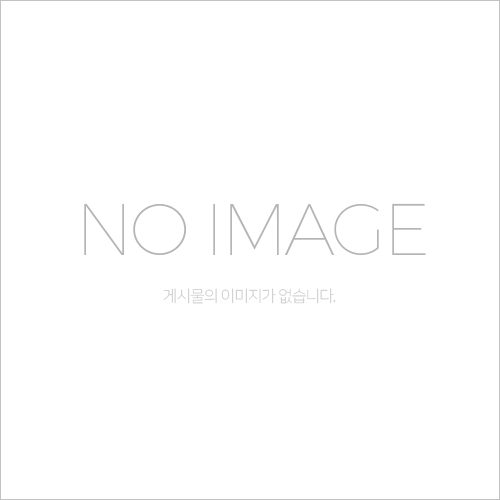
뮈텔 Gustave Charles Marie Mütel, 1854~1933 뮈텔 주교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천주교가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1892년의 약현성당 완공, 1898년의 명동대성당 완공, 그리고 1925년 로마에서 거 행된 '한국 순교자 79위에 대한 시복식'이 모두 조선 대목구장 뮈텔 주교의 지도력 아래서 이루어졌다.뮈텔은 안중근의 정치적, 민족적 대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하 얼빈의 거사를 교리상의 '죄악'으로 단정했다. 그는 안중근의 거 사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공공연히 표명했고 안중근에게 성사를 베푼 빌렘 신부를 중징계했다.안중근이 처형된 후 안명근이 독립군 군사학교 설립을 위한 모금 운동을 전개할 때, 빌렘 신부는 이 모금 운동을 안명근이 주도하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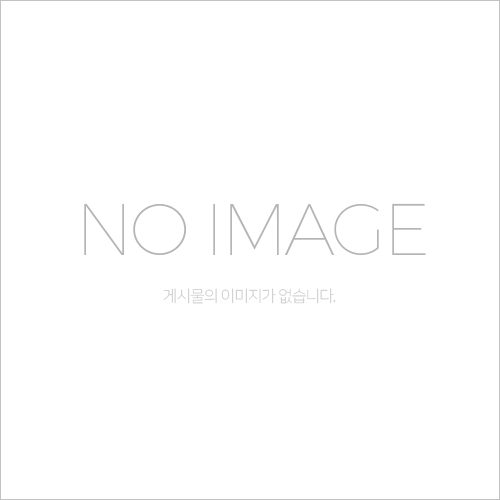
빌렘 Nicolas Joseph Marie Wilhelm, 1860~1938 빌렘 신부는 뮈텔 주교의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여순으로 가서 처형 직전의 안중근에게 고해성사와 성체성사를 베풀었다.빌렘은 안중근의 거사를 이해하고 지지했다기보다는, 성직자로서의 종교적 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일로 뮈텔 주교는 빌렘에게 이 개월간의 성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빌렘은 뮈텔 주교에게 강력히 항의했고 파리 외방 전교회와 교황청에 부당함을 호소했다. 그후로 빌렘과 뮈텔의 불화는 계속되었고, 빌렘은 1914년 프랑스로 돌아갔다. 빌렘은 모젤 지방의 사랄브에서 일흔아홉 살의 나이로 사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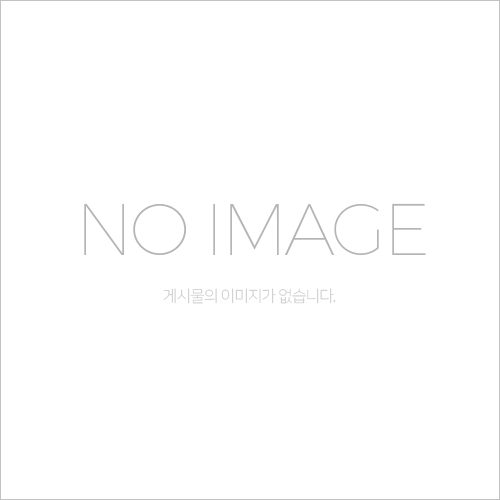
안명근安明根, 1879~1927 안명근은 안중근의 큰아버지인 안태현安泰鉉의 장남이다. 안명근은 안중근의 거사에 감화받아서 무장 독립 투쟁의 길로 나섰다. 안명근은 안중근이 처형당하기 한 달쯤 전인 1910년 2월 21일 뮈텔 주교를 찾아가서 빌렘 신부를 여순감옥의 안중근에게 보내서 고해성사를 베풀어줄 것을 요청했다. 뮈텔은 이 요청을 거절했고, 이날 안명근의 태도가 '무례하게 보였다'고 일기에 기록했다.안명근은 북간도에 독립군을 양성할 군사학교를 세우려고 황해도 일대의 부호들을 설득해서 기부금을 받아냈다. 이 모금 운동은 상당한 성과가 있었는데 모금 과정에서 정보가 노출되었다. 안명근은 1910년 12월에 평양에서 체포되었고, 이 사건과 연루되어 황해도 일대에서 백육십 명이 검거되었다. 일제는 검거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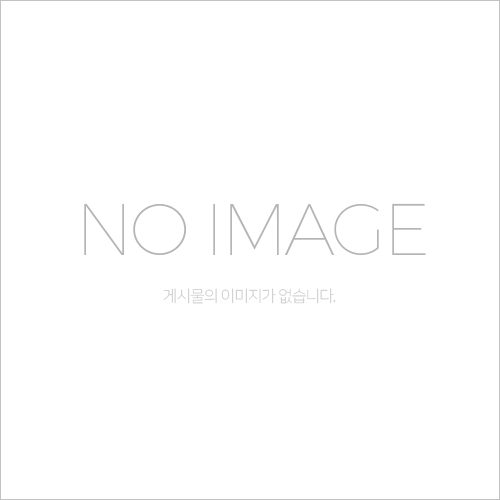
안공근安恭根, 1889~? 안공근은 안중근의 둘째 동생으로 나이 차이는 열 살이다. 안 공근은 상해에서 구미 공사관의 통역과 정보원으로 활동하면서 안중근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는 한편 여러 독립운동 단체에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안공근은 김구의 최측근으로 활동했 다. 안공근은 김구가 기획한 이봉창, 윤봉길 의거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고 대외적으로 김구의 대리인 역할을 했다.1937년 10월, 일본군이 상해를 공격하자 김구는 안공근을 상해로 파견해서 김구 자신의 어머니 곽낙원과 안중근의 직계가족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안공근은 김구의 가족을 데리고 왔으나 안중근의 가족을 데리고 오지 못했다. 김구는 이 일로 안공근을 심하게 질책했고 이것이 한 원인이 되어서 김구와 안공근의 관계는 불편해졌다.안공근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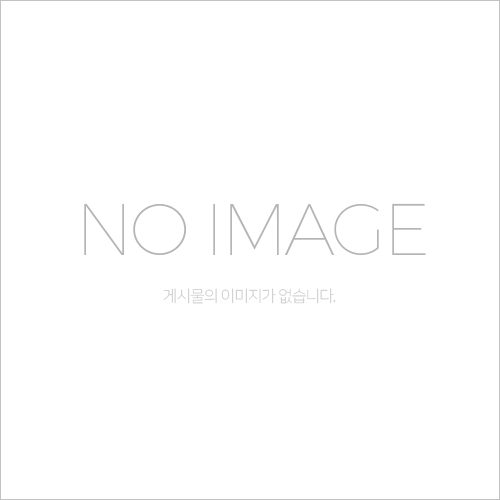
안정근安定根, 1885~1949 안정근은 안중근의 동생으로 여섯 살 연하이다. 안중근의 거 사 직후 안정근은 진남포 경찰서에 연행되어 일 개월간 취조를 받고 풀려났다. 안정근은 풀려나자마자 여순으로 가서 안중근이 처형될 때까지 옥바라지를 했다. 안중근이 처형된 후 안정근은 자신의 동생 안공근과 형 안중근의 가족들을 데리고 블라디보스 토크로 이주했다. 안정근은 잡화상을 경영해서 성공했고, 독립 운동을 위한 물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안정근은 스물다섯 살 무렵부터 대가족의 가장 역할을 떠맡 았고 북만주 독립운동의 지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안정근은 안 창호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독립운동 자금 모금과 모병, 교육에 헌신했다. 안정근은 여러 독립 투쟁 단체들의 통합을 추 진했고, 청산리 전투에 참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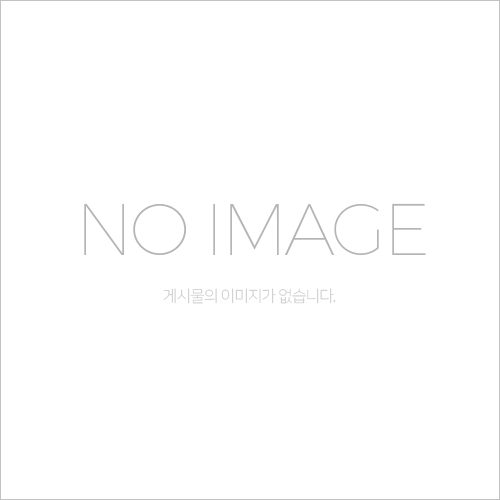
김아려金亞麗, 1878~1946 1894년 안중근과 결혼해서 2남 1녀를 두었다, 안중근의 거사후 가족들과 함께 러시아 극동 지역과 만주, 상해를 옮겨다니 며 살았다. 1910년에 남편 안중근이 처형당하고, 그 이듬해인 1911년에 큰아들 분도가 일곱 살로 만주에서 죽었다. 1939년, 1941년에는 둘째 아들 안준생과 맏딸 안현생이 총독부의 기획 에 이끌려 서울에서 '박문사 화해극'을 벌였다.김아려는 중일전쟁 이후에 상해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광복 후에도 귀국하지 않았고, 1946년 상해에서 죽었다. 김 아려의 생애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고, 김아려의 고통과 슬픔에 대한 기억이나 기록도 남아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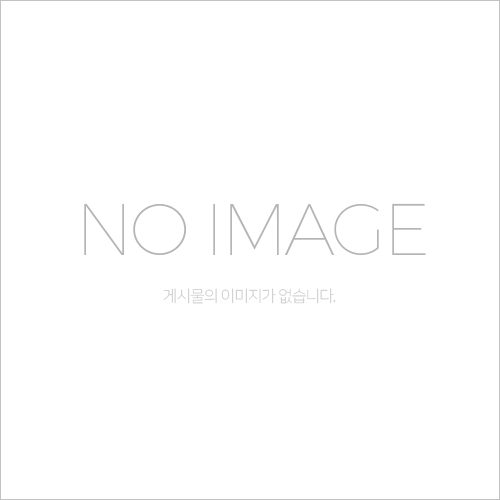
안현생安賢生, 1902~1959 안현생은 안중근의 장녀이며 안분도와 안준생의 누나이다. 1909년에 안중근의 처 김아려가 두 아들을 데리고 한국을 떠날 때 여덟 살 안현생은 명동 수녀원에 맡겨졌다. 안현생은 1914년 에 블라디보스토크에 살고 있던 가족들과 합류했고, 1919년 이 후에는 상해에 정착했다.안준생이 '박문사 화해극'을 벌인 지 일 년 오 개월 후인 1941년 3월 26일에 안현생은 남편 황일청黃一淸과 함께 서울에 와서 박 문사를 참배했다. 3월 26일은 아버지 안중근의 기일이었다. 이 번에도 총독부 촉탁 아이바가 안현생 부부를 안내했다. 이날 안 현생은 '아버지의 죄를 사죄한다'고 말했다고 서울에서 발행되 는 신문들이 보도했다. 안현생 부부는 상해에서 아이바와 가까 운 사이였다. 안현생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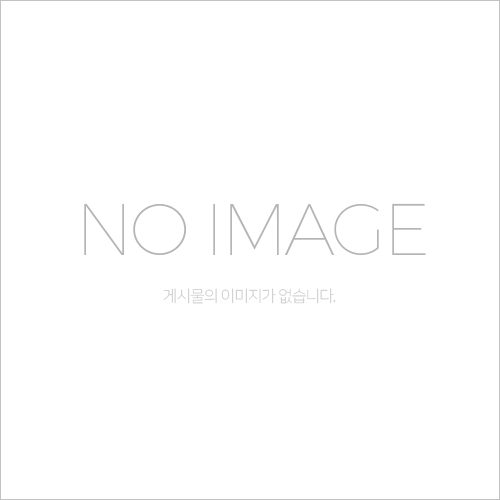
안준생安俊生, 1907~1952 안준생은 안중근의 차남이다. 1907년 안중근이 집을 떠날 때 안준생은 어머니 김아려의 몸속에서 육 개월 된 태아였고 아버지 안중근이 처형될 때는 약 삼십 개월 된 아기였다. 안준생은 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이 없고, 안중근도 차남의 얼굴을 본 적이 없다. 안중근의 거사 후 안준생은 유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러시아 극동 지역과 북만주 일대를 옮겨다니며 자랐고, 1919년 이후에는 상해에 자리잡았다.1939년 가을에 안준생은 한국에 왔다. 안준생의 한국 일정은 조선총독부 외사부장 마쓰자와 다쓰오松澤龍雄와 촉탁 아이바 기요시相場淸가 동행하면서 안내했고 소노키 스에키園木末音가 통역했다. 소노키는 안중근 사건 관련자들의 신문과 재판의 전 과정 을 통역했던 인물이다.1939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