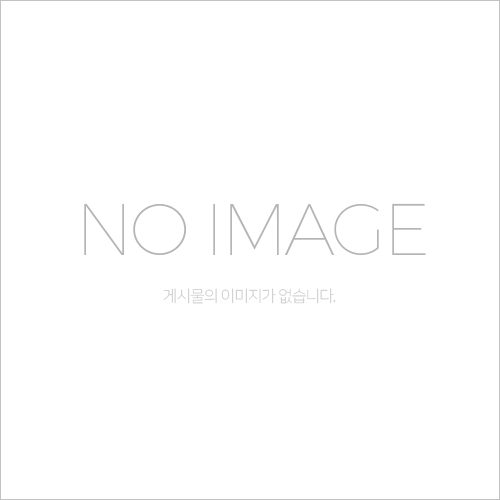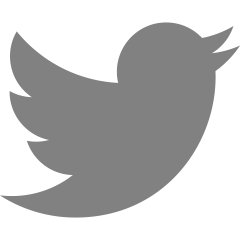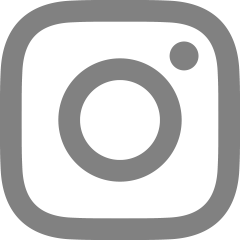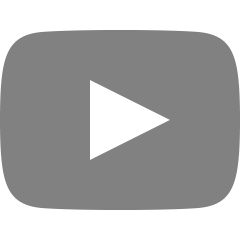하얼빈 : 김훈 - 뮈텔
뮈텔 Gustave Charles Marie Mütel, 1854~1933
뮈텔 주교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천주교가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1892년의 약현성당 완공, 1898년의 명동대성당 완공, 그리고 1925년 로마에서 거 행된 '한국 순교자 79위에 대한 시복식'이 모두 조선 대목구장 뮈텔 주교의 지도력 아래서 이루어졌다.
뮈텔은 안중근의 정치적, 민족적 대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하 얼빈의 거사를 교리상의 '죄악'으로 단정했다. 그는 안중근의 거 사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공공연히 표명했고 안중근에게 성사를 베푼 빌렘 신부를 중징계했다.
안중근이 처형된 후 안명근이 독립군 군사학교 설립을 위한 모금 운동을 전개할 때, 빌렘 신부는 이 모금 운동을 안명근이 주도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뮈텔 주교에게 이 같은 정보 를 편지로 알렸다.
빌렘의 편지는 1911년 1월 11일 명동성당의 뮈텔 주교에게 도착했다. 이날은 눈이 많이 내려서 서울 전역에 눈이 덮였다. 뮈텔은 편지를 받은 즉시 눈길을 달려서 조선 주둔 일본군 헌병 사령관 겸 조선총독부 경무총장 아카시 모토지로 明石元二郎를 찾 아가서 이 정보를 제공했다. 아카시는 크게 감사했다.
안명근은 1910년 12월에 체포되었고 뮈텔은 1911년 1월 11일 에 안명근의 동태를 아카시에게 제보했다. 그러므로 뮈텔의 제 보가 안명근 체포의 결정적 단서가 되지는 않았다. 뮈텔은 자신 이 아카시에게 제보한 내용이 '조선총독부에 대한 조선인들의 음모'와 여기에 안명근이 관련된 사실이라고 일기에 적었다.
뮈텔이 말한 '조선인들의 음모'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 만, 안명근의 모금 활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일 수도 있다. 이 사건의 수사와 재판은 모금 활동을 훨씬 넘어서서 광범위하 게 전개되었다.
이 무렵 진고개(서울 중구 충무로2가)에서 명동성당에 이르 는 구역을 일본인들이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어서 명동성당은 통 행에 불편이 많았다. 명동성당은 일본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 기했으나 거듭 패소했다. 1월 11일 아카시를 만난 자리에서 뮈 텔은 이 통로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카시는 부하를 불러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이튿날인 1월 12일 도로는 정리되었다.
감옥에서, 안명근은 성직자들에게 거듭 편지를 보내 고해성사 를 요청했다.
1911년 9월 17일에 르각 신부가 안명근을 면회했다. 르각 신 부는 안명근이 '매우 쇠약해 보였다'고 뮈텔 주교에게 보고했다. 1912년 2월 3일에 빌렘이 안명근을 면회했다.
1915년 4월 2일 감옥에서 보낸 안명근의 편지가 뮈텔에게 도 착했다. 안명근은 편지에서 뮈텔에게 고해성사를 베풀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었다.
옥중의 안명근이 성직자들의 면회와 고해성사를 거듭 요청하고 있는 정황으로 보아서, 안명근은 빌렘과 뮈텔이 자신을 일본 헌병대에 제보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또 빌렘과 뮈텔도 이 같은 사실을 안명근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 다. 그리고 빌렘과 뮈텔은 안명근이 이 제보의 사실을 모르고 있 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와 관련된 성직자들의 내면은 매우 복잡하거나, 또는 매우 단순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빌렘과 뮈텔만이 아는 일이 고, 후인이 말하기 어렵다.
뮈텔은 조선에서 대목구장으로 사목하는 사십여 년 동안 매일 같이 일기를 써서 남겼다. 『뮈텔 주교 일기』는 한국 천주교회사 와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기록으로 평가된다. 뮈텔은 1933년 여든 살의 나이로 사망해서 서울 용산 성직자 묘지에 묻혔다.
'[책과 나무] > 독립운동사 추천도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하얼빈 - 김훈 : 빌렘 (0) | 2025.03.07 |
|---|---|
| 하얼빈 - 김훈 : 안명근 (0) | 2025.03.07 |
| 하얼빈 - 김훈 : 안공근 (0) | 2025.03.07 |
| 하얼빈 - 김훈 : 안정근 (0) | 2025.03.07 |
| 하얼빈 - 김훈 : 조마리아 (0) | 2025.03.07 |